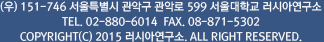서울대 러시아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KOREA AND CENTRAL EUROPE IN THE EARLY- AND MID-20th CENTURY”

-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2014년 11월 1일에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20세기 초중반 한국과 중부유럽(KOREA AND CENTRAL EUROPE IN THE EARLY- AND MID-20th CENTURY)”의 개회사에서 러시아연구소 소장인 신범식 교수는 서울대 러시아연구소의 창립 목적과 함께 중부유럽과 한국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2014년 6월 본 연구소에서 강연회를 했던, 야로슬라브 올샤(Jaroslav Olsa Jr.) 전 주한체코대사이자 현 주필리핀체코대사가 축하 메시지와 아울러 중부유럽과 한국 관계의 역사를 개관하였다. 뒤이어 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이자 러시아연구소의 자문위원인 하용출 교수가 축하인사와 함께 러시아연구소 사반세기의 역사를 반추하고 본 학술회의가 그동안 한국의 대유럽 외교사 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중동부 유럽과 한국 관계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먼저, 하용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 “국제정세에서 중부유럽과 남·북한(Central Europe and Two Korea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에서는 1950년대의 국제 정세 속에서 중부유럽과 남·북한 간에 숨겨진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주로 발표되었다. 첫 번째 순서인 웨더스비 교수(Kathryn Weathersby, 존스 홉킨스대)의 발표, “중부유럽의 안보와 한국 전쟁의 연장 결정(Central European Security and the Decision to Prolong the Korean War: Evidence from Russian and Romanian Archives)”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1953년까지 연장된 데는 중동부 유럽에 공산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국 측의 관심을 극동으로 돌리려 한 스탈린의 의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52년 초반에 박헌영, 김일성 등은 미국에서 제안한 협정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스탈린에게 밝혔지만, 이 화친 제의를 물리쳐야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무대로 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스탈린의 우려 때문에 1952년의 협정은 성사되지 못했다. 마오쩌둥 또한 한국에서의 전쟁이 지속됨으로써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1953년 스탈린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종전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다. 토론을 맡은 김명섭 교수(연세대)는 한국전은 내전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 ‘한국 내의 세계전쟁’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한국전쟁을 세계적 차원에서 조망했다는 점에서 웨더스비 교수의 발표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한국전쟁의 발단의 원인은 스탈린이 아닌 김일성에 돌리는 것이 더 타당하며, 전세계적 차원의 공산주의 블록 내에서 소련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충 설명하였다.
- 뒤이은 마이어 교수(Brian Meyers, 동서대)는 “동유럽의 외교관들: 북한 사상사의 간과된 목격자들(East European Diplomats: Neglected Witnesses to North Korean Ideological History)”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김일성이 사상가이자 지도자로서의 굳건한 입지를 지녔다고 확신하는 수정주의 역사가들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1950~60년대 동유럽 외교관들의 기록에는, 김일성이 의미있는 사상가 및 지도자가 아닌 우스꽝스럽고 독선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1955년 북한만의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주창한 김일성의 선언이나 대내적인 국수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도 동유럽 외교관들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마이어 교수는 동유럽 외교관들의 기록은 자국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어 북한을 미화하는 등 이면의 목적에 좌우될 필요가 없었으므로, 북한만의 특수성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미국이나 서구의 기록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서 정병준 교수(이화여대)는 “앨리스 현, 한국의 마타하리인가, 혁명 투사인가(Alice Hyun: Korea’s Mata Hari or a Revolutionary?)”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한국에서는 미군과 북한의 이중간첩으로서 ‘마타하리’와 같은 인물로 치부된 앨리스 현(Alice Hyun)의 일생을 재평가하였다. 앨리스 현은 배재학당, 정동제일교회, 임시정부 등에서 활동했던 현순(1798~1968)의 맏딸로, 그의 집안은 1920년대부터 박헌영과 가까이 지냈다. 그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1930년대 중반까지 헌터 칼리지, 컬럼비아대 등지에서 공부했으나 1935년 학업을 중단하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정착, 공산당원으로 활동했다. 정병준 교수는 앨리스 현의 주한미군 활동이 그녀가 미국 측 간첩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녀가 1945년에 주한미군에 입대한 것은 사실이나 반년 후인 1946년 5월 한국에서 추방되는데, 만약 그녀가 미군의 정보요원이었다면 『신천지』 1946년 5월 호의 ‘미국의 여성’이라는 기사에서 인터뷰한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병준 교수의 추측에 따르면 그녀의 주한미군 활동은 공산당을 위한 첩보활동의 일환이었다. 이후 그녀는 LA에 정착한 후 ‘조선민족혁명당’의 미국 지부에서 활동하는 한편, 프라하에 유학 중인 그의 아들 웰링턴 정을 통해 북한으로의 망명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프라하의 한국인 고고학자 한흥수의 중개도 있었다. 1949년 8월 그녀는 이사민과 함께 북한으로 망명한 이후 박헌영의 비서로 일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녀는 북한에서 1953년 5월 미군의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1955년 사형을 언도받고, 그 이듬해에 처형되었다. 토론자 마상윤 교수(카톨릭대)는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버림받은 앨리스 현의 일생은, 역사적 흐름이 개인사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한국계 디아스포라의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최정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 “중부유럽의 한국인들(Koreans in Central Europe)”의 첫 발표자인 전 주한체코대사이자 현 주필리핀체코대사 야로슬라브 올샤(Jaroslav Olša, Jr.)는 직접 모은 사진자료들을 바탕으로 “99장의 슬라이드로 본 체코와 한국의 상호교류(Story of Czech-Korean Interactions in 99 Slides)”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표자는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 군함을 타고 와 강화도에서 조선군과 전투를 벌인 윌리엄 루크스(William F. Lukes)를 한국에 온 최초의 체코인으로 제시했다. 이후 1901년 유명한 체코인 여행작가 엔리케 스탄코 브라즈(Enrique Stanko Vráz)가 직접 조선에 여행 와서 조선의 생활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글로 묘사하여 발표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조선의 임시정부 인사들은 독립을 위해 서구의 지원을 받고자 했고 그들이 서구와 교류하는 창구가 바로 체코였다. 그 덕분에 일찍이 체코에도 한국 문화가 소개될 수 있었다. 1932년에는 체코어로 번역된 한국전통민담집이 출간되었고, 1936년에는 프라하에서 한국 화가 배운성의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특히, 1943년부터 프라하에 살게 된 한국인 한흥수의 역할은 한국-체코 교류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프라하의 동양학연구소에서 최초로 한국어를 가르쳤으며 김남천의 『대하』, 김시습의 『금오신화』 등을 체코어로 옮겼다. 1948년에는 공산당이 수립한 체코공화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체코공화국이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두 국가 간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발표자인 올샤 대사는 당시 체코공화국의 지원군이 북한에 머무르며 찍었던 귀한 사진들을 청중에게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소련 및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성립된 대한민국과 체코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약 100여년에 걸친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조감하면서 발표자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체코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인 쉬르머 교수(Andreas Schirmer, 비엔나대)는 “1930~40년대 독일어권 국가들의 한국인들(Koreans in German Speaking Countries during the 1930s and 40s)”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 연구주제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전경수 교수와 함께 했던 2008년의 세미나에서 촉발되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를 통해 비엔나에 살았던 한흥수라는 인물을 알게 된 쉬르머 교수는 20세기 초반 독일어권 국가들에 살던 다른 한국인들로 연구범위를 넓혔다. 1929년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1934년 뮌헨의 루드비히-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한국의 초등학교: 일본의 동화교육”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재원, 1935년 비엔나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도유호 등이 쉬르머 교수가 새롭게 발견한 인물들이다. 특히, 발표자는 “문화의 맥락에서 본 한국사의 문제들”이라는 도유호의 박사학위 논문에 주목했다. 비엔나 역사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된 이 논문의 일부는 찢겨진 채 보존되어 있는데, 쉬르머 교수는 찢어진 부분의 내용과 누군가 논문의 여백에 적어둔 코멘트의 내용을 비교했다. 그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텍스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제스처들(훼손 정도, 메모, 문체 등)에 천착하여 당시 조선의 암울한 상황을 대면하는 지식인의 태도를 조심스레 추측하려 했다.
- 2부 마지막 순서로 흘라스니 교수(Vladimír Hlásný, 이화여대)는 “전후 시기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한 한국 활동가들의 정치적 망명(Political Migration of Korean Activists through Czechoslovakia in the Postwar Period)”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에 따르면, 1940~50년대 사회주의를 지지한 한국인 정치 활동가들은 체코슬로바키아를 경유하여 평양에 가려고 했다. 또, 냉전 이후 미국에 있던 한인 사회주의자들 역시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 평양의 급진주의자들과 소통하고 이상적인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흘라스니 교수는 이러한 정치적 망명의 흐름을 시기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개척자들, 2) 자발적인 선구자들, 3) 강제로 추방된 자들. 첫 번째 부류는 1930년대부터 이미 서구의 문물을 배우고자 유럽으로 건너가 한국의 존재를 알렸던 인물들로 한흥수와 김경한이 있다. ‘개척자들’보다는 약간 뒤늦게 1940년대에 체코를 통해 북한으로 가고자 했던 활동가들로는 앨리스 현과 그의 아들 웰링턴 정, 그리고 이사민, 선우하권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한인 사회주의자들로 냉전 체제가 공고해지기 이전부터 사회주의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격화된 냉전 체제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 내 한인 사회의 공산주의 활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비(非)미국인 활동 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ee, HUAC)”가 세워졌고, 많은 한인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을 떠날 것을 강요받았다. 1960년대 초반 북한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들은 체코를 경유해 평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곽정순, 곽춘자, 존 전, 다이아몬드 김 등). 발표자는 이들의 전기적 사실들을 수집하면서 한국인 망명의 세 가지 흐름을 구분한 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서구와 동구 사이,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사이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수행했던 국제적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웨더스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3번째 세션 “한국의 중부유럽인들(Central Europeans in Korea)”의 첫 순서로 이택선 박사(서울대)는 “Czech-American Charles Pergler: Contributor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에서 한국 헌법과 독립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중부유럽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퍼글러(Charles Pergler)의 일생을 조명했다. 활동의 첫 번째 시기(1918.10~1920.01)에 퍼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첫 주미 대사로서, 미 정부와의 군사지원 협정에 참여했다. 이 때 그를 통해 얻어진 무기는 한국군에게 팔려 청산리대첩때 사용되었다.
두 번째 시기(1920.02~1921.03)에 그는 시베리아에서의 체코슬로바키아 죄수 송환을 위해 일했다. 세 번째 시기(1946.04~1948.08)에 그는 한국에서 미군정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는 그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법률에 있어서 전문가였기 때문으로, 그는 미국법과 일본법간의 충돌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또한 그는 법률고문 활동을 통해 한국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임시 헌법 제정에 중요한 조언을 했다. 그의 활동을 추적하면 냉전기 미국의 국제정책과 한국의 법제사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 이어서 네프(Robert Neff, 왕립아시아협회)의 발표, “조선의 초기 오스트리아-헝가리인들(Early Austro-Hungarians in Joseon Korea)”에서는 막스 터블스(Maximillian Taubles)의 삶이 집중 조명되었다. 터블스는 1845년 프라하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1885년 한국에서 사망하였다. 한국의 문호 개방 당시 한국으로 찾아와 일했던 서양인들 중 몇몇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출신이었는데, 터블스 역시 그 중의 하나이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경우이다. 그는 뉴욕으로부터 모험의 땅인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다양한 일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에는 여러 잡지에 글을 쓰는 일도 있었다. 그는 한 잡지의 극동지역 통신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1885년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미신을 비웃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을 지녔던 그는 천연두 예방접종 권유를 외면하고 한국으로 떠났지만,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던 천연두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았다. 한국에서 죽음을 맞은 첫 번째 서양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실패한 모험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한국과 서양의 첫 만남의 장면들 가운데 하나로써 가치가 있다.
- 마지막으로 바브린소바 박사(Zuzana Vavrincova, 브라티슬라바 코메니우스 대학)의 발표 “체코공화국의 고문서자료를 통해 살펴본 중립국 감시위원회(NNSC)에서의 체코슬로바키아의 활동(Czechoslovakia’s Activities in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een through the Archival Documents in Czech Republic)”이 이어졌다. 발표자에 의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최초로 북한을 인정하고 수교를 맺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와 그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비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는 공유된 이데올로기 등의 이유가 존재했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NNSC의 멤버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남한은 스웨덴과 스위스를 지명했다. 그러나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고문서 자료에 따르면 그 원인은 NNSC 내부에서의 소외, 그리고 북한-중국 관계의 강화로 보인다. 해당 자료에는 스웨덴, 스위스, 미국이 서로 친밀했으며 자신들은 여기서 소외되었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이 스웨덴, 스위스와 대립했다는 주장이 발견된다. 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북한의 관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비교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자는 주장했다.